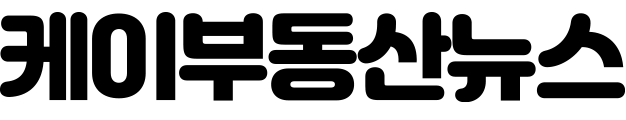![[절기와 풍속] 백로, 이슬 맺히고 가을이 깊어간다... “흰 이슬이 내리기 시작… 오늘은 白露" / 김교민 기자 ](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0936/art_17572084160672_9b6b60.jpg?iqs=0.2651459878963749)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4절기 가운데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白露)는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에 위치한다.
태양의 황경이 165도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양력으로는 9월 8~9일 무렵, 음력으로는 8월 초순에 해당한다. 이름 그대로 ‘흰 이슬’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과 물체 위에 이슬이 맺히는 자연 현상에서 유래했다.
이때부터는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드러난다. 예로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백로와 추분 사이를 초후·중후·말후의 삼후(三候)로 나눠,
- 초후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 중후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 말후에는 뭇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하여 가을의 변화를 표현했다.
백로 무렵은 장마가 끝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지만, 간혹 태풍과 해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기 쉽다. 특히 벼농사에 있어 중요한 시점으로, 벼 이삭은 늦어도 백로 전에는 반드시 패야 한다고 여겨졌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중추(仲秋)와 맞물려 찬바람이 불면 벼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으며, 제주도에는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이는 백로 전에 이삭을 패지 못한 벼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의미다.
충남에서는 “백로 전에 벼가 패야 먹을 수 있고, 지나서 패면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있고, 경남에서는 백로 후에 패는 벼는 쭉정이가 된다는 믿음도 있다.
이렇듯 백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농가에서는 백로 전후의 바람과 벼 이삭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 풍흉(豊凶)을 점쳤다. 백로 바람이 세차면 “벼는 여물지 못하고 색이 검어진다”는 우려가 뒤따르기도 했다.
또한 백로 무렵에 비가 오면 풍년이라는 속신도 있다. 경남의 섬 지역에는 “8월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천석을 늘린다”는 말이 있고, 참외나 오이 농사도 일찍 백로가 들면 작황이 좋다는 경험칙도 전해진다.
이 무렵은 조상 묘를 찾아 벌초를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여름 농사를 마친 농민들이 추수를 앞두고 잠시 일손을 놓는 시간으로,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러 가기도 했다.
절기마다 자연의 변화와 농사의 지혜를 담아낸 우리 선조들은 백로를 단순한 기상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이슬이 맺히는 새벽 공기 속에서 곡식의 결실과 계절의 성숙을 읽어냈던 것이다.
오늘 하루, 땅을 적시는 이슬 위에 가을의 깊어짐과 한 해 결실의 무게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