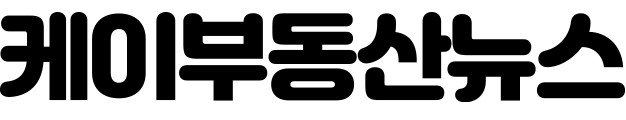![[절기와 풍속] “모기도 입이 삐뚤어지는” 가을의 길목… 오늘은 처서(處暑) / 김교민 기자 ](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0834/art_17559466563709_7966ec.jpg?iqs=0.2641816768215232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4절기 중 열네 번째인 처서(處暑)는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이 150도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양력으로는 대개 8월 23일경, 음력으로는 7월 15일 무렵이다. 이름 그대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다.
흔히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자연의 순환을 느끼게 한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처서의 15일을 5일씩 3등분하여
- 초후(初侯)에는 매가 새를 잡아 제를 지내고,
- 차후(次侯)에는 천지에 가을 기운이 돌며,
- 말후(末侯)에는 곡식이 익어간다고 하였다.
처서가 지나면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풀이 더 자라지 않아 논두렁 잡초를 정리하고 벌초를 시작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장마철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말리는 ‘음건(陰乾)’ 또는 ‘포쇄(曝曬)’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무렵이면 모기나 파리의 극성도 누그러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는 속담도 생겨났다.
또한 음력 7월 15일 백중(百中) 이후는 농한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농촌에서는 “어정 칠월, 건들 팔월”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바쁜 모내기와 보리 수확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며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다.
하지만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 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벼 이삭이 패는 시기로, 맑고 강한 햇빛을 받아야 벼가 잘 익는다. 그래서 “처서에 장벼 패듯”이라는 표현도 생겨났다.
반대로 비가 오면 흉작의 징조로 여겨졌다. “처서비는 십리에 천석(千石)을 감한다”, “독 안의 쌀도 준다”는 속설처럼, 이 시기의 비는 곡식에 수분 피해를 입혀 수확량을 줄인다고 믿었다.
전북 부안이나 경남 통영처럼 대추나 곡식 재배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처서에 비가 오면 큰 애기들이 울고 간다”는 말도 있다. 처서 무렵 비로 인해 결실이 줄면 혼수를 준비하던 큰딸의 근심이 커진다는 현실적 속담이다.
결실을 앞둔 농부에게 처서는 단순한 절기를 넘어선 시기다. 태양의 이동과 자연의 순환을 기준으로 삶을 조율해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풍속과 속담은, 오늘날에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준다.
더위가 물러가는 길목, 오늘의 하늘을 바라보며 가을의 시작과 수확의 희망을 함께 떠올릴 때다.